‘세상 끝 집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에이즈로 투병하면서, 혼자 살아온 시간보다 쉼터에서 더 오래 살아온 나였기에 그 제목만 들어도 그 집의 분위기, 그들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집에는 늘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봄날의 훈훈한 바람이나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이 아닌 메마른 나뭇잎들을 날려 보내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고, 어느 때는 가슴 속을 시리게 하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내쫓기고 내버려져 세상 끝 집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누구랄 것 없이 에이즈에 찍힌 낙인에 지쳐 저항할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표정들. 낯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경계하는 눈빛들. 혹시라도 자신의 병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몸짓들. 내일이란 말이, 희망이란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들에게는 찬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의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고는 했다.
나는 그 집의 서늘하고 냉랭한 기운이 너무 싫었다. 왜 우리에게는 따스한 기운이 없는 걸까. 세상은 왜 우리의 따스한 기운을 빼앗아 가버렸을까. 그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루만져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단단한 아픔에 나 역시 무기력할 때가 많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아파해 주는 것밖엔 없었다.
그러나 내 아픔도 커다란 데 남의 아픔까지 들여다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어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세상 가장 끝에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각자의 아픔 때문에 서로가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가 냉랭한 그 관계. 그리고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들. 때맞춰 밥 먹고 때맞춰 잠자고 한집에 살면서도 밥 먹을 때 외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다. 어쩌다 마주쳐도 그림자 지나가듯 지나가고, 어쩌다 대화를 나눠도 자신의 몸 아픈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여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디가 안 좋대.’ 과거에 살아온 이력이나 언제쯤 여기를 나가 앞으로 무얼 하며 어떻게 살 건지 속 깊은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에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기서 나가 무얼 하며 어떻게 살 건지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말은 하지 않아도 한숨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지라 지켜야 하는 규칙들. 밤늦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외출할 때는 언제쯤 들어올 건지 얘기해야 하는 등, 등, 등.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든 세상 끝 집을 나와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벽장 속으로 숨어버리고 만다. 누군가 나의 병을 알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남들의 눈치를 살피고 경계하며, 에이즈로 인한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침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그 집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침묵은 죽음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나에겐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었다. 에이즈란 병이 알려져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그들의 벽장은 견고하고 단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침묵 속에 단단해져가고 커져만 가는 그 아픔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여전히 고민이다. 그래도 소수의 몇몇이 나의 인권활동을 응원해주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며 격려해 주었다. 그 귀한 격려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서늘하고 냉랭한 기운이 맴도는 세상 끝 집. 아픔이 구석구석 쌓여 있는 집이지만 우리에겐 꼭 필요한 공간이다. 몸이 아픈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세상 끝 집이 없다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두어 달 전 쯤, 세상 끝 집을 나와 세 번째 독립을 했다. 운 좋게 싸고 좋은 월세 옥탑방 하나를 얻었다. 오랜만에 나만의 공간에서 남들 신경 안 쓰며 살자니 편하기가 그지없다. 삼시세끼 잘 챙겨먹고 산다. 지금의 건강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혼자 잘 버티려 한다. 내 방 앞 옥상에 바람이 불어 문을 여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훈훈한 바람이 봄바람이다. 세상 끝 집에도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윤 가브리엘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 웹진 '랑'의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매월 동인련 활동 소식,
회원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꼭 필요한 글들을 싣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은 정기/비정기로 할 수 있으며, 후원 하실 분들은
http://www.lgbtpride.or.kr/lgbtpridexe/?mid=support 를 클릭해주세요^^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정부, 기업의 후원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인들의 정기, 비정기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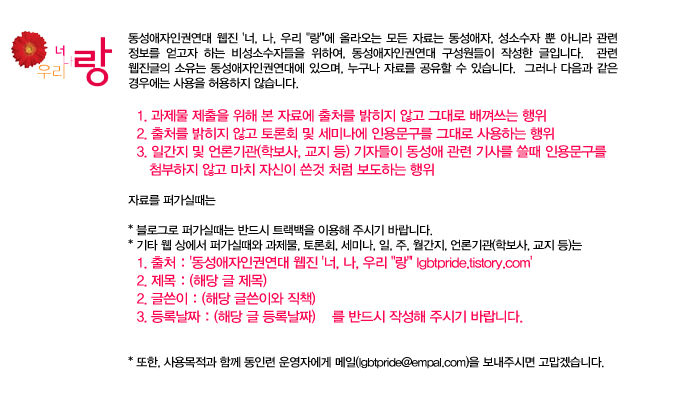
'회원 이야기 > 가브리엘의 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발행준비 1호] 나의 현재가 HIV/AIDS감염인의 미래가 되지 않길 (0) | 2008.0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