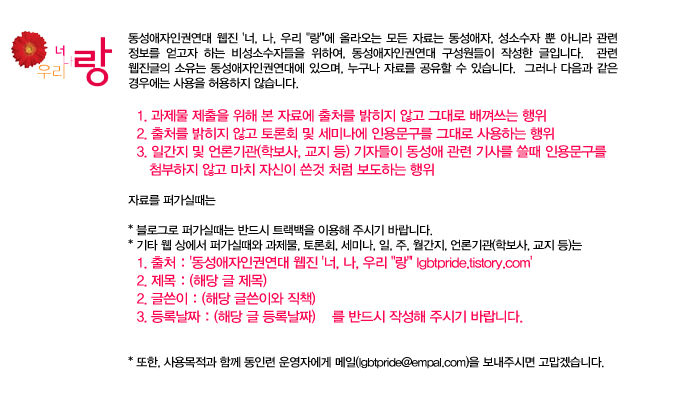- 동인련과 함께한 5월의 광주
신이에게 전화가 왔다.
글 하나를 쓰란다.
반갑지 않은 전화였다.
분명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겠노라고 한다.
백수는 언제나 소심하고 한가해야 하기에 별 불평도 못하고,
딱히 핑계거리고 못 찾고, 그러겠다고 허락, 아니 인정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이모 덕분에, 평소 새벽 5시의 클럽같이 휑한 우리집이 좀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내방에 자리를 잡았다.
좋은 기회다.
'글이나 써야겠다.'
망가진 컴퓨터 때문에 손글씨를 써야한다는 생각이 미치자,
내 마지막 섹스 때 굴렸던 나의 몸보다
오랜 시간동안 쓰지 않았던 연필을 찾기 위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연필, 연필깎기, 종이는 꼭 이면지어야 하고, mp3에, 적당한 쿠션, 차도 한잔 ……
역시 글쓰기는 쉬운 것이 이닌듯 싶다.
광주 ……
광주는 나에게 고향 같은 이름이다. 딱히 고향 이라는 추억이나 정 따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실제 사전적 의미의 고향은 대전이다.
그리고 그 고향은 내 기억 상에서 , 가본 적 없는 '파타야' 같은 곳이다.
지도상 어디에 파타야가 있는 지도 모르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말 그대로 단어뿐인 곳이다.
솔직히 아직도 난 대전이 손바닥만한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 (꼭 호랑이란다. 난 그 호랑이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지만) 배 쪽에 있는지 등 쪽에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광주는 나에게 좀 더 고향적이다.
처음 광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갈 생각은 없었다.
언제나 내 삶이 그렇듯이 인생은 '하루지난 도너츠' 같아서 배고프면 먹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내 돈 주고 사먹을 적극성 따위는 부재할 뿐이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은 남자와의 화끈한 잠자리는 뜻하지 않은 기쁨을 안겨주는 법이다.
이번 광주여행이 그랬다.
그 남자는 생각보다 아름다웠고, 요리도 잘했으며, 잘 놀 줄도 알고, 더욱이 진실한 모습도 있었다.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의 연속이며, 연착의 연속인 법
(특히나 이반들의 여행은……) 정시에 출발하리라 믿었던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었을까?
한 시간 정도 늦게서야 시작된 여행은 폭우로 평상시보다 더 길어졌다.
일정은 두개뿐이라고 들었다.
광주에 들어서자마자 '태권브이'님과 5.18 공원으로 향했다. 매년 tv 에서 꼭 한번씩 은 보였던 곳. 무슨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처럼 사진 찍던 국회의원들의 모습.
그래서 연예인을 실제로 본 것처럼 무덤덤했다. (사진과 별 다르지 않았음으로)
분명 5.18 이 무슨 사건인지, 어떻게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학습되었지만 , 그리고
구슬픈 비와, 공원주변으로 흐르는 귀신 나올 것 같은 음악도 흐르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덤덤했다.
비에 젖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발걸음이 나에게는 더욱 필사적이었다.
필사적인 발걸음으로, 필사적으로 구 묘지까지 돌았을 때는 이미 내 뱃속도
음식물을 찾아서 필사적이 되었다.

다음 일정은 구 청사 방문이었다.
할아버지의 막걸리 냄새가 입구부터 흥건했다. 그리고 반 층위의 화장실 냄새까지.
비까지 내리니 말 그대로 추적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몇 시간 전부터 기다렸다는 말과는 다르게 빔프로젝터 에서는 " 다운로드 5분 남았습니다." 가 10분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5분도 넘게 그러고 있었고. 온 가족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료의 행방을 찾던 설명자는 결국 자료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청사가 헐릴 위기에 처했다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길어지는 설명에 조금씩 집중력이 흩어졌다.
설명이 계속되면서 저만치서 할머니 두 분이 들어와 우리 그룹에 자리를 잡으셨고
아저씨의 설명이 끝나기에 맞춰 당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
내 아들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청사에 남아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노라고……
그 당시 정확히 청사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셨다.
일흔이 넘으신 할머니께 있어서 죽은 아들의 육신은 국립공원에 있을망정 그 영혼은 청사에 있어보였다.
그 후로 할머니는 청사를 볼 때마다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다.
수 십 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물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삼십년 가까이 마르지 않은 채 흐르고 있었다. 마치 가장 비극적인 영화의 결말처럼, 할머니가 앉아계시던 그 곳이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곳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죽음을 다른 이들에게 끝없이 알려야 하는.
그렇게 할머니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를
스스로 헤치며 뱃속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계셨다.
이미 안내자의 설명이 충분히 길었던 터라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그 정도에서 끝이 나야만 했다.
두개였던 행사의 하나가 끝이났다.
나는 충분히 배고팠고, 처음 먹어보는 전라도의 코스요리의 맛은 이전의 무거움을 날려버릴 만큼 충분히 맛있었다. 무거워지는 몸과 반비례해서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인련 사람들이 술을 마다하는 모습도 보았다.
게이 라이프 평생에 다시 못 볼 진기한 관경이었다.
이때야 말로 음식이 술보다 맛있어지는 순간이었는지 모르겠다.
삶은 참 버라이어티 한 것 같다.
너무 쉽게 가벼워진 마음을 보며 내가 너무 철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언제나 슬프지도 언제나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인간이다.
할머니의 일생이 온통 슬픈 추억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황당한 삼단 논법은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에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똑바로 알고 있다.
그 할머니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은 것은 단지
내가 광주가 아닌 대전에서 좀 더 늦게 태어난 우연일 뿐이라는 것을.
papercut _ 동성애자인권연대
_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1박2일 광주방문 행사에 동인련 회원 다섯 분(종철, 태성, 욜, Papercut, 나라)이 참석하여 광주의 생생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의 의의에 대해 함께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광주의 동성애자 bar를 방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인련을 소개하는 등 광주의 성소수자분들과 소중하고 따듯한 만남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행성인 활동 > 활동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퀴어문화축제를 가게 되기까지... (3) | 2009.07.06 |
|---|---|
| 미소가 떠나지 않던 날 (1) | 2009.07.06 |
| 4월 이야기 (4) | 2009.04.28 |
|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또 하나의 무지개별 (0) | 2009.03.30 |
| 동인련 회원프로그램 ‘외출’ (3) | 2009.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