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나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쪼개서 유용하게 보낼까. 물론 오늘의 지나친 과음이 내일 계획된 모든 스케줄을 망가트릴 수 있어도, 주어진 시간동안 활동과 나의 삶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잘 쪼개서 사용할 지 늘 고민하게 된다. 촛불과 함께 밤새도록 지내다보면 다음날 회사를 가야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계속 확인하며 집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고, 퇴근 후 중요한 활동 회의를 가야하는데 회사동료들과 계획에 없던 회식자리라도 잡히기라도 하면 나로 인해 활동에 피해가 갈까 전전긍긍한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회사 동료들은 가끔 날 보고 눈을 반쯤 감고 다니는 피곤맨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철저한 이중생활은 힘들다. 요즘엔 빈틈이 자주 보여 걱정도 된다. 회사에서 동인련이나 이반시티 웹사이트를 열어놓고 팀 회의에 들어가 1시간 이상 방치된 적도 있고, 활동 회의록을 인쇄하고 찾지 않아 프린터 주변에 ‘성소수자’‘투쟁’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문서가 돌아다닌 적도 있다. 가슴이 철렁 해 질 법도 한데, 그냥 편하게 ‘얼마나 오래 다닐꺼라고’생각하며 덮어둔다. 회사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자연스럽거나 혹은 자연스럽지 않거나
난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자신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들어간다. 나 역시 한달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월세에, 후원금, 보험료, 생활비. 생각만 해도 한숨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 입사 3년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회사 다니는 것을 연장하고, 그 시간동안 주변 동료, 상사들과 불편함 없이 다니느냐이다. 아이러니하겠지만, 1년마다 계약서 갱신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이 사실이고, 남아있는 시간동안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숨기고 지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회사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반가우면서도 한편에서 1시간동안 나는 무지개 대열에 함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있게 무지개 친구들을 소개시켜줄 수 없었다. 누구는 철저한 이중생활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존재를 숨기고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 지독한 스트레스다. 소개팅 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회사 여직원 사이에서 정욜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했다. 분명 숨겨놓은 애인이 있거나, 게이이거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여자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꽃미남 메트로섹슈얼 게이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몸과 얼굴은 전혀 게이스럽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설득력은 조금 떨어졌다. 게이코드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블 tv나 언론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사실 이 고민은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성소수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이자 현실이다. 비정규직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에 살면서, 성소수자가 회사동료일 수 있음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지 않거나 혹은 자연스럽거나
촛불로 전국이 뜨겁다. 미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반서민적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 역시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 서민으로 살면서 호모포비아 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나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해 이명박은 처음부터 싫었다. 난 분노의 마음을 담아 촛불을 들고 무지개 깃발 아래에 있다. 누구는 말한다. 무지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안도감을 갖는 다. 그런데 난 왜 무지개 아래 있을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로서의 의무감도 있지만 무지개 아래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24시간을 쪼개도 게이로서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촛불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간마저 이 사회에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
그렇다면 촛불집회 가운데 무지개는 얼마나 자연스러울까. 무지개를 깃대에 달아 펴는 순간 우리 자긍심도 살아 숨쉰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저건 뭔가”하는 표정이다. 그런들 어떠하리! 무지개는 멀리서 보고만 있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내어 무지개 대열에 오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존재, 자금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집회 도중 깃발을 사진채증을 하는 경찰에게 뺏긴 적이 있다. 나도 그랬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모두 분노하고 슬퍼했다. 저게 얼마나 예쁜 깃발인데... 무엇보다 우리 자긍심이 상처를 입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람들은 무지개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 직접 드러내고 밝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회사에서도 촛불에서도. 너무 귀찮고 꼭 필요한 일 일까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나 여기 있소” 하고 표식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알지 못한다.
나는 성소수자들이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아도 혹은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살아있는 동안 과연 그렇게 혁명에 준하는 큰 변화가 생기겠냐라고. 그리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그냥 편하게 숨기고 살면 되는데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드러낸 그 긴장의 순간을 즐기는 것과 체념하고 있는 익명의 다수가 우리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드러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닳는 것이다. 이번 주말이 끝나면 난 또 나의 존재를 숨기며 회사로 가야한다. 늘 그랬듯이 주변 동료들이 볼까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메인화면에 나와 함께 사는 파트너 사진도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겠지만 큰 변화를 꿈꾸며 무지개 대열에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기고 우리의 역할을 찾을 때 비로소 큰 변화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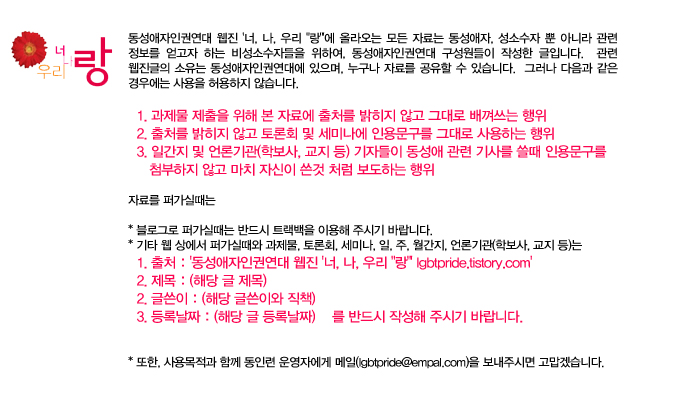
'회원 이야기 > 정욜의 세상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0.3.11 전남대 강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KTX 열차 안에서. (5) | 2010.03.29 |
|---|---|
| 장례식장의 이중풍경 (4) | 2009.04.28 |
| Part 3. 너의 꿈을 더해봐 : 동성애자인권연대 꿈 이야기 (2) | 2008.10.30 |
| Part 2. 희망바라기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이야기 (3) | 2008.09.29 |
| 4명의 게이들이 함께 떠난 4일간의 솔직 담백한 여행 이야기 (3) | 2008.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