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행성인 회원, 토크쇼 패널)

그날의 점심은 특별하지 않았다. 관계의 정체성이라고는 직장 상사와 하급직원이라는 점이 전부였고, '낯설다'라는 말을 넘어서 젓가락질 하나하나도 모두 노동인 60분이었다. 그가 내게 던진 첫 질문은 "아이가 몇 살이죠?"였다. 사실 그는 1년 전 이맘때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아이가 없다는 나의 대답에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그때와 같은 답변을 했고 이내 자신이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사과하면서 "서두를 것 없다"고 했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내게 내년에도 얼마든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질문을 할 기회가 없다하더라도 그의 머리 속에 주어진 정상성이라는 표준과 잣대는 빠르게 대상을 스캐닝하고 그물망 사이에서서 판단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에피소드는 직장생활 15년 동안 특별하지 않게 일어난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지나치게 빈번하고 일상적이다. 더 큰 문제라면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에피소드가 공고한 차별로부터 비롯되며 오히려 제도로부터 방어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우리는 일터라는 링 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을 준비와 미움받을 용기로 가드를 올린 채 하루 8시간 이상 싸우며 살아간다.
그 시간, 노동이 끝난 뒤 가장 자연스러운 각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로를 환대한다. 어쩌면 그제서야 가장 나다운 모습, 내가 바라는 노동을 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치있는 ‘노동’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밥벌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함께 바라는 세상, 사라져야 할 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를 왜곡과 차별 없이 바라봐야 한다. 가난과 장애가 부끄럽지 않고, 상하관계에서 명령하거나 정보가 불평등하게 흐르지 않으며, 결정권자에게 주어진 권위에 비민주적으로 의존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야 한다.
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동 뒤에 만나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는 다르다. 누군가의 우월한 능력보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난 사람들의 쟁기질이야말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역사와 힘으로 축적될 것을 믿는다.
2019년 11월 15일, 종일의 노동 끝에 '일 끝나고 만난', 밥벌이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눈 밤. 우리는 그 힘으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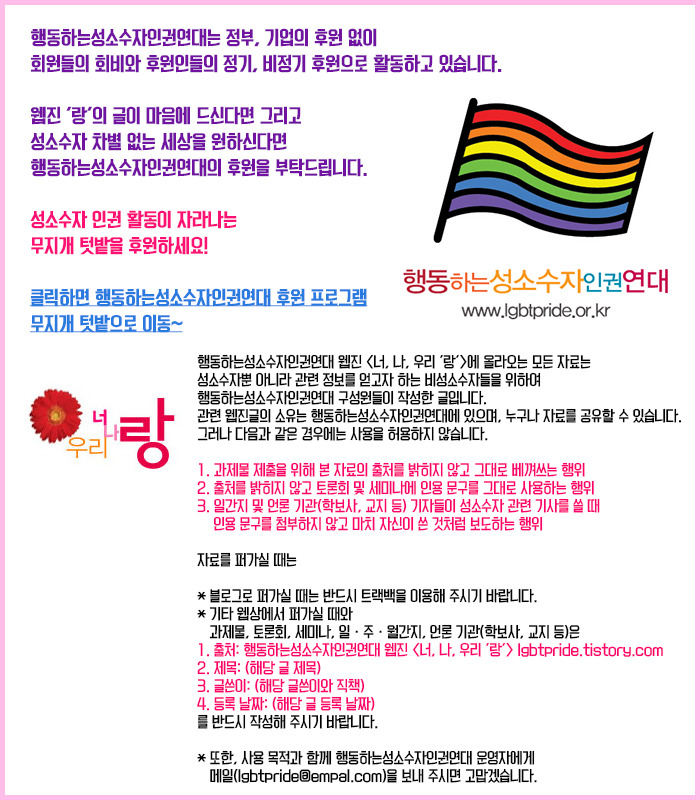
'성소수자와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와 성소수자-노동자] 벗들의 이야기 ① (0) | 2020.04.28 |
|---|---|
| [코로나19와 성소수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로 존재하기 (0) | 2020.04.14 |
| 성소수자, 우리의 노동에 대해 말하다. (0) | 2020.01.01 |
| ‘일터’와 ‘성소수자’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 - '나, 성소수자 노동자 - 두 번째 이야기' 인터뷰 결과 발표회 후기 (0) | 2018.01.25 |
| 나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후기 (0) | 2018.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