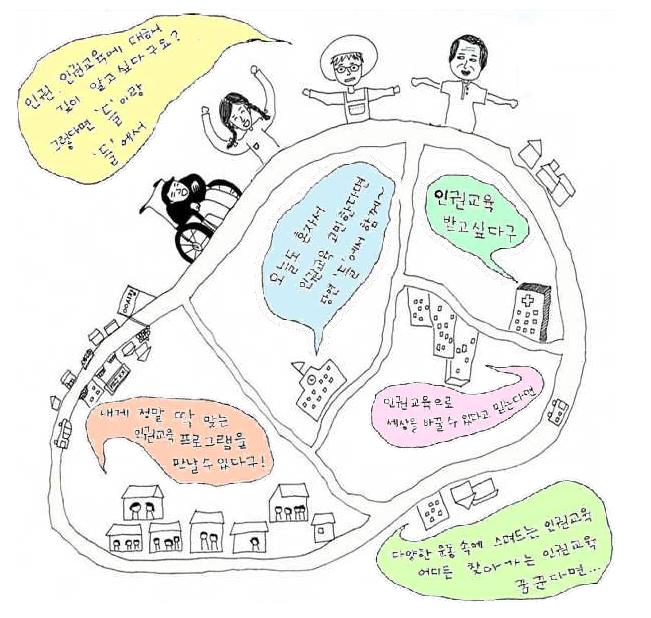동인련 웹진 "너, 나, 우리 '랑'" 9월호
“전, 그런 사람을 여태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엔 한 명도 없는데… 우리랑 너무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다.”
‘동성애자’라는 단어에 쏟아지는 말들. 조금 전까지 내가 알고 지내던 게이친구 누구누구, 레즈비언 누구 씨, 얼마 전에 알게 된 트랜스젠더 누구 씨는 일순간 세상에 없는 존재가 돼 버린다. 방금 전까지도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흐릿해지며 투명인간처럼 사라지는 가슴 철렁하는 이 순간은, 말썽 많은 어느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이나 어떤 교회의 설교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교육’ 시간에 벌어진다.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혹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사람들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등장하는 이 ‘당당한’ 경험들로 인해 동성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
인권교육에서 만나는 동성애자는 장애인, 이혼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하는 청소년, 학생 등 다른 소수자**와 함께 소개되지만 가장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과연 이 비난의 세력들이 동성애자의 지지자로 인권 옹호자로 돌아 설 수 있을까. 인권교육에서 동성애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인권교육시간에 등장하는 ‘동성애자’는 존재자체를 부정 당한다. 물론 인권교육에서만이겠는가. 어쨌든 너무도 확신에 찬 이런 경험담은 교육에 참여한 돌출적인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말에 힘입어 자신 뿐 아니라 주변까지 확대해서 단언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아유~ 우리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 자주 보나본데, 우리 지역엔 없어요. 한 번도 본적이 없다니깐.”이라고, 어느새 지역 총평에 나서기도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좀 쉽고 나름 가깝게 시작하려고 준비해간 일반적인 사례들, 말하자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라든지 언론에 소개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들.. 뭐 이런 얘기는 꺼내기도 전에 동성애자는 본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투명인간’이나 ‘우주인’으로 둔갑한다. 존재 자체의 부정, 배제된 동성애자 차별의 시작이라는 동성애자 친구의 말을 몸소 느끼는 가슴 답답한 순간이다.
‘공감’ 깔기!
그래도 ‘만난 적 없다’는 식의 반응에는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경험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수년전이라면 누군가 내게 물어봤더라도 비슷한 대답을 했을지 모른다. 동성애자 동료, 친구를 두게 된 현재, 생각해 보면 그들은 보통의 직장인 보통의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더라.’는 고백이 나름 공감의 기반을 만든다. ‘동성애자’를 본 적 없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던 자신의 태도가 외면당하지 않고, 낯선 느낌이 당신만이 아니라는 위로는 완강했던 저항을 조금 수그러지게 한다.
자신의 경험을 공감 받지 못하는 것에도 상처를 받는데 정작 그 경험이라는 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함으로 남지만, 그래도 1단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하는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불완전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로 곧 확인된다.
‘동성애자한테 차별은 차별이네, 그러게 문제네’하고 동의하면서도 끝에 붙는 말… “난 싫어” 이야기는 길어진다. 동성애자 인권이 아니라 인권일반에 대한 교육에서 다양한 사람 중 하나로, 소수자의 하나로 살짝 소개된 동성애자의 이야기는 불꽃 튀는 설전이 되었다가 때론 인간임을 호소하는 설득으로 옮겨 다니며 끝장을 보기도 한다. 물론 ‘생각해보기’라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평온함을 들쑤시는 ‘동성애자’라는 단어는 인권교육에서 비장의 무기로 쓰일 때가 있다. 눈가에 힘을 주며,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전투적인(?) 마음으로. (^^;)
만나서 다행이야~
다양성에 대한 존중, 차이의 인정, 차별금지 등 인권의 기본적 내용을 교육하는 시간에 소수자의 인권은 빼 놓을 수가 없다. 어찌 보면 그 권리의 배제가 소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이존중․차별금지를 교육할 때, 소수자의 인권을 요리조리 고민하며 참여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권리투쟁 당사자의 증언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참여는 인권교육에서 고려되는 방법, 내용이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당사자의 경험이 맹렬한 비난을 지지와 옹호로 돌아앉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는다. 이주노동자 삶의 실태, 학생인권의 현황에 대한 증언은 때때로 참여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인권교육을 일찌감치 함께하고 있는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성소수자인권운동 그룹들은 마음 든든한 벗이다. 소수자의 삶을 통해 인권교육에서 눈 뜨게 되는 인권감수성은 놀라움과 감동이다. 그들이 없다면 이런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날 수 있다는 정체성’과 함께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양가의 고민은 인권교육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 그대로의 증언이 편견에 균열을 내는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인권교육에 관심과 실천을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권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직 개별 소수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을 세심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점이기도 한데, 짧은 인권교육의 역사지만 동반자로 오래 같이 해온 동성애자인권운동 그룹에 거는 바람이기도 하다. 동인련에게 살짝 기대어 볼까하는 야무진 생각이…(들켰나요?) 아니, 함께 해보자는 말씀이지요. 잘 만난 짝꿍이 되길 기대하며..
*인권교육센터 들이 궁금하시다면 www.dlhre.org 홈페이지나, 친절한 ‘욜’에게 문의를!(^^;)
**이러저러한 지적에도 아직 ‘소수자’라고 쓰는데, 다른 적절한 표현 환영합니다.
고은채 _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성소수자 차별 혐오 > 동성애 혐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성애 혐오없는 세상에 살고싶습니다! (2) | 2010.09.14 |
|---|---|
| 키스 해링 액숀 데이!! (3) | 2010.09.08 |
| 키스해링전시는 가능? 동성애자 인권행사는 불허?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상한 소마미술관 출입원칙! (4) | 2010.08.05 |
|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가? ' 맑시즘 2010 강연 참가기 (1) | 2010.08.05 |
| 2009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희망 (2) | 200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