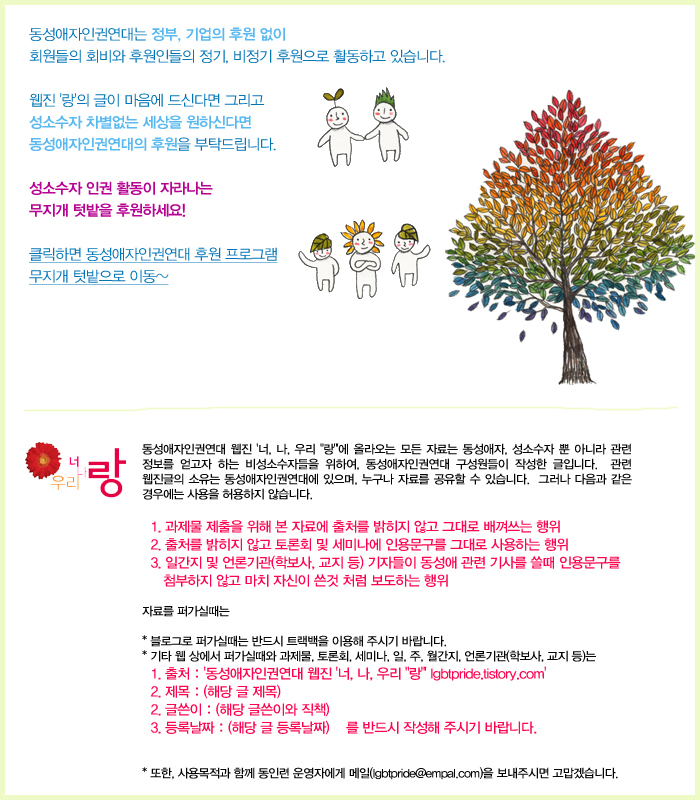長篇小說

金 飛
12. 데리다 - 패밀리, 가족 혹은
“정말이야? 정말 헤어진 거야?”
“뭘 자꾸 물어? 사람이라는 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별거냐?”
“그래도 이 누나 이번에는 좀 달랐잖아요? 매번 누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걔네들은 원 나잇이었고…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사람 이야길 뭐 그렇게 상세하게 할 게 있냐?”
“놔둬라, 쟤네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를 때다. 키스하면 사귀고, 같이 자면 결혼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충격 받아.”
“그래서 형은 괜찮다 싶으면 일단 한 번 자보고, 악수하듯 키스하고… 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게 또 슬슬 사람 성질을 긁기 시작하네?”
“너야말로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을 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냐.”
“이 형 안 그렇게 봤더니… 형, 형도 순결 어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성애자들이 하는 건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건 변태 짓이라는 거예요? 이성애자들이 섹스하다가 걸리는 병은 성병이고, 동성애자들이 섹스하다 걸리는 병은 죽을병이다 뭐 그거요? 이 무슨 개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우리 데리다 형, 좀 깨어있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우리 형이 뭐가 어때서요? 그럼 형처럼 몸을 막 굴리면서 사는 건 깨어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보수 꼴통이란 거예요? 그거야 말로 뭣 같은 소리 아니에요?”
“쟤 또 시작이다. 야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왜 자꾸 멀리 가니 멀리 가길?”
“그래, 다들 너무 멀리 가는 거야. 이성애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야? 어디든 상우 선배 같은 사람도 있고, 데리다 선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무성애자를 사랑해서 고통스러운, 나 같은 인간도 있는 거고. 에휴!”
“누난… 어때?”
“뭐가?”
“헤어진다는 거… 나는 매번 쫌 힘들던데… 내 애인은 유부남이고 와이프도 있고 애들까지 있는데도, 헤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여기가 찌릿해. 그냥 찌릿한 정도가 아니라 날카롭고 무거운 걸로 긁어내는 것 같애.”
“글쎄… 모르겠네.”
“모르긴 뭘 몰라? 괜찮지는 않지. 한 동안 얼굴이 활짝 폈는데, 오늘은 완전 맛이 갔는데 뭘. 잠이나 제대로 잔거냐?”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차라리 차인 거면 맘이라도 편하지.”
“가족에 관한 이야길 했는데 화를 냈다고?”
“그럼 그 형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하필 그때 가족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족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그 사람 가족에 관해서는 좀 알아?”
“그냥 뭐… 부모님이 별거 중이시라는 거 하고… 그 사람은 어머님 손에 자랐다는 거, 아버지랑 따로 사는 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래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 뭐 그 정도예요.”
“에이, 그럼 그 형 주변도 마냥 편안하지만은 못했겠네.”
“세상에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기만 한 가족이 어딨니? 사람이라는 게 다 제 각각인데, 드라마에서 보듯 그렇게 끼니때마다 모두 모여 같이 밥 먹고, 하다못해 형제들 일에도 화를 내든 머리통 깨지게 싸우든 관심 가져 주고,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난 우리 아버지랑 말 한 마디 하는 일도 며칠에 한 번이고, 내 동생은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차라리 아무 관심도 없는 형네 집은 그나마 나은 편이네. 저는 아직도 생일 때만 되면 가족들이 화장품이니 원피스니 그 따위 것들을 선물해 주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내 정체성 같은 거 아직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거지. 희망이 아니지, 소원이지,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런 소원?”
“우리 엄마는 좀 공주같이 자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것도 몰라,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결국에는 좋은 여자 만나 평범하게 살 거라고 믿고 계셔. 좋게 말하면 낙관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이고.”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고? 그거 아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우울한 사람이래잖아. 매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심하대.”
“어떻게 생겨먹은 부모든, 난 그런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 말 안 듣는 동생이나 언니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때 동생이랑 싸우고 언니에게 맞았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왈칵 울어버린 적도 있었어.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거야,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나한테는 왜 가족이 주름 많고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혼자뿐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억울하더라? 허허허.”
“어? 현아 누나, 운다! 누나 울어요?”
“울긴 왜 울어? 그런 걸로 우는 건 중학교 때 다 끝냈어. 안 울어, 이젠. 허허허.”
우는데 뭘? 그럼 눈에서 나오는 그건 콧물이냐? 콧물이 눈에서 질질 흐르냐? 하여간 저 아줌마 청승은. 정용호, 너는 왜 잠자코 있어? 평소 같았으면 제일 목소리 높여 떠들던 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잠해?”
“그냥요.”
“그냥이 어디 있어? 너도 네 가족들 이야기 좀 해 봐. 너처럼 싸가지 없는 애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한 번 들어나 보자고, 응?”
“저희 가족은… 그거였어요. 아까 형이 말했던 TV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 밥 먹을 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가족들이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함께 고민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도 했어요. 그게 지겹거나 싫지도 않았고, 아빠나 엄마도 재미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가족들이 제일 좋은 친구였고 든든한 사람들이었어요.”
“히야! 짜식… 너 복 받은 놈이었구나?”
“근데… 근데 난 왜 견딜 수 없이 우울했던 거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족을 가졌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
“나는… 나는 왜 그토록 혼자서 외롭고 괴로웠던 거냐고요?”
“……”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아, 예… 갑니다!”
김비: 2007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플라스틱 여인>이 당선돼 등단했다. 장편소설<빠쓰 정류장>·<붉은 등, 닫힌 문, 출구 없음>, 산문집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복희 씨>·<슬플 땐 둘이서 양산을> 등을 냈다. 한겨레신문에 ‘달려라 오십호(好)’를 연재 중이다.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은 2014년 김비 작가가 웹진에 연재한 '나의 우울에 입맞춤'을 2022년 수정한 원고입니다.
'무지개문화읽기 > [김비 장편소설 연재]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14. 산 - 세이브, 오토매틱 (0) | 2015.03.10 |
|---|---|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13. 새 - 구해줘, 겁이 나 (0) | 2015.03.04 |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11. 산 - 파르마콘, 시간의 (0) | 2015.02.15 |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10. 새 - 모르겠어, 행위 수행적 언어는 (0) | 2015.02.08 |
| 우리의 우울에 입맞춤 |9. 산 - 괴물, and (0) | 201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