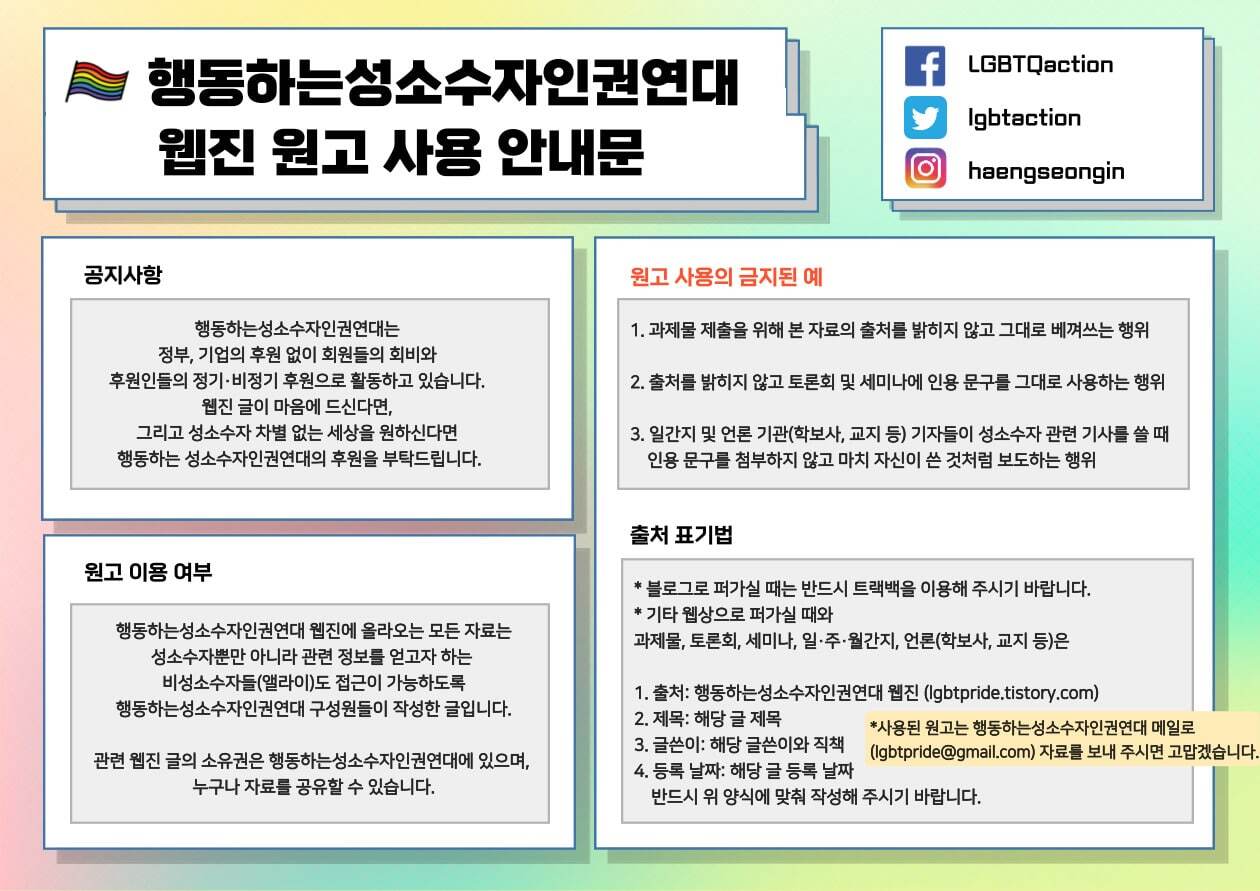글, 그림: 무나(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 인권팀)
원가족과의 불화에 관한 일화는 널리고 널렸다. 특히 퀴어라면 더더욱. 나는 원가족을 지독히도 미워했다. 원가족과 같은 집에서 십 대를 보내며 스무 살만 되면 집을 나가 원가족을 버리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세상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한때 원가족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대학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부친의 소원 중 하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간만에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늙어버린 부친에게 생계에 필요한 돈을 받으며 나름 평화롭게 연을 이어 가고 있다. 내가 행성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활동에 이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해 봄, 활동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무리했다 싶을 정도로 여러 활동을 했다. 겨울부터 기획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을 3월에 올렸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5월 아이다호 투쟁대회 기획단에 참여했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와중에 아이다호 투쟁대회 날을 목표로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맡기도 했다. 아이다호 투쟁대회가 끝난 후에는 행성인을 비롯한 여러 단위와 함께 서울퀴어퍼레이드 차량을 기획했고, 종강을 맞이하자마자 서울퀴어퍼레이드 차량을 준비해야 했다. 덕분에 학교 성적은 간신히 학사경고를 면했다.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나니 학사경고를 한 번 더 맞으면 잘릴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나는 왜 이 판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거나 책임져야 하는 일을 맡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제 그만 발을 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기도 했다.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의 오프닝에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제가 찾는 건 사람인데요, 저와 같은 언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이요.’ 퀴어 친구들이 생기기 전, ‘트랜스젠더’라는 이름으로 정체화하기 전, 세상은 나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다. 원가족은 나를 이해하거나 지지해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원가족의 좁은 우주 속에 머무는 동안 나는 다른 우주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곤했다. 그래서 원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다. 나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런 존재가 나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주길 바라기도 했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있게 된다면, 스스로 생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어진다면, 혹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누군가 나의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면, 그때 나를 대신해 내 삶을 결정해 줄, 내 삶을 마무리해 줄 사람은 원가족이 아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애인에게 주려 했지만 실패하기만 했다.
“언젠가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 싶어”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언젠가 탑수술(유방절제수술)을 하고 싶어”라고 말한다. 기약 없는 ‘언젠가’가 따라붙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비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다. 나에겐 스스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시간 동안(그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하더라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재활의 시간 동안 나의 몸을 만져도 괜찮은 사람이 필요하다. 수술한 나의 몸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구한다고 구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 모든 역할을 해주기는 힘들다. 심지어 애인이 생겨도 애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사람이 언젠가 생기긴 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없이 외로워진다.

어떤 이들에게 운동은 제도를 바꾸는 일일 것이다. 당장 자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와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운동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물론 나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도 존재한다. 공고한 성별 이분법적 문화, 성중립 화장실, 제3의 성별, 본인인증 과정에서의 성별 확인 문제 등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있다. 하지만 어쩐지 이런 일들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짠, 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저 먼 나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활동은 쟁취해야 할 권리를 위한 투쟁의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왜 돈도 안 되는 이 일에 본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일까? 본업과 균형을 맞추는 일에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며 친구는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답한다.
“근데, 거기 가면 덜 외로워.”
성소수자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른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나는 함부로 특정 성별로 패싱 되지 않으며, 혹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굳이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당연하지 않은 상식이 여기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되고, 배워야 할 상식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전한 언어를,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활동은 연대이고 그 연대란 나와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타인을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과정이다. 그런 연대 속에서 서로가 있어 덜 외롭기를, 언젠가는 서로에게 같은 언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재미있는 노래 한 곡을 남긴다.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 하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아 사랑스런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런 사람들
”
'회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원에세이] 괴물을 좋아하는 게이 이야기 (0) | 2023.08.22 |
|---|---|
| [회원에세이] 그래도 BDSM은 폭력적이지 않나요? (0) | 2023.08.22 |
| [회원 에세이] 저 이 정도면 "애기 호모" 탈출인가요? (0) | 2023.07.26 |
| [회원에세이] 활동가, 칼럼, 지면의 미덕- 경향 오피니언을 마무리하며 (0) | 2023.06.23 |
| [회원에세이] 혐오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