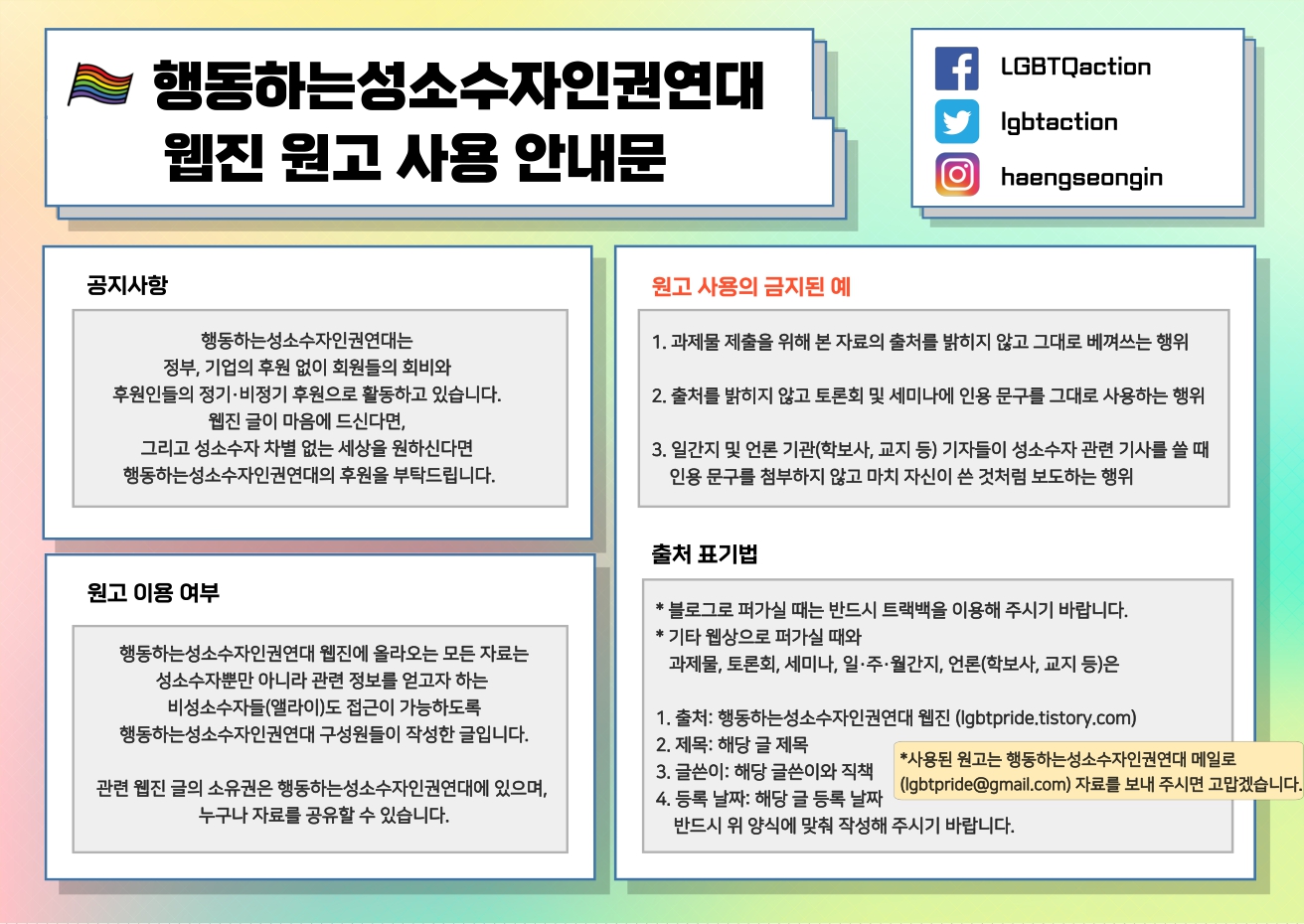남웅(행성인 미디어TF)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슬쩍 봄내음을 남기며 떠나보내고야 마는 4월의 끝자락.
2019년까지 행성인은 장애운동과 ‘이상한 문화제’를 했다. 연대문화제는 성소수자와 장애인 뿐 아니라 홈리스, 청소년, 세월호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촘촘한 기획이랄 것도 없을뿐더러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접점을 애써 만들지도 않지만,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부당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 애도조차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는 행동들이 연결되었음을 감각한다. 그렇게 연결 다음의 걸음을 상상할 만 하면 문화제가 끝나곤 했다. 연결의 기쁨만큼이나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는 아쉬움을 매번 느꼈다. 연결을 지속할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매년 이맘때쯤 평가회의에 나왔던 것 같다.
한편에서는 단체에서 떠난 이들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추모해야 하는 사진들은 늘어가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적어도 회원들이 이름은 알고 언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서로 알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 회원모임은 ‘추모와 기억의 시간’을 주제로 잡아 내부 행사를 가졌다. 교육장 한켠에 떠난 행성인 동료들의 사진을 놓고 이들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기획했다.

사진 속 동료들이 누구이고 언제 활동을 했는지 한명씩 소개했다. 얼굴마다 눈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도슨트와 쇼호스트가 된 것 같은 불온한 기분도 들었지만, 뭐가 되든 일단은 중구난방의 기억들을 모아서 나눴다. 중간중간 말이 막혔고 이름과 생몰년도만 아는 생면부지의 동료들도 있었다. 기억하기 위해 당신의 사진을 꺼내 보고, 기억이 나지 않음을 언제고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각자 다른 시절을 오고 간 이들은 행성인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그 전신인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에서 활동했다. 살았다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을 이들의 얼굴들을 모아놓고 보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들이 한데 모인 이상한 회원모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성인 활동을 하면서 저들 중 몇몇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장례식은 단순히 동료를 보내고 슬퍼하는 자리로만 남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례식장은 원가족이 기억하는 ‘본명’의 세계와 퀴어 동료로서 ‘닉네임’의 세계가 빗장을 열고 조우하는 장소가 된다.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생전 몰랐던 그의 모습을 확인하지만, 그의 원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중에는 고인이 트랜지션 중이라는 사실마저 알지 못했거나 나중에 알더라도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도는 위계적이다. 우리는 말을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침묵이 싫은 누군가는 술을 먹고 난장을 부려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십수년 사겼을지라도 동성 파트너의 인정여부는 원가족의 판단에 달리곤 한다. 고인이 봉안되는 장소를 따로 찾아가 인사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마음 속에, '우리'라는 울타리에 그를 묻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라고 위계가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부고를 알리고 애도를 말하지만, 그가 HIV감염인이었고 약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퀴어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답답함과 부채감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남아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상처로 남는다. 우리는 따로 모여 속을 풀고 거듭 서로를 달래고 서로에게 미안해한다. 성소수자의 애도는 슬픔과 분노 외에도 부채감과 수치심을 동반한다.

끈질기게 기억하는 것, 기억할 수 없다는 무력함 까지도 기억하는 것, 그와 나 사이 내밀한 기억을 남겨놓으면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억을 분할하며 공공의 자원으로 남겨놓는 것이 공동체 안팎의 역할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당신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커뮤니티의 윤곽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을 확인시켜준다. 명과 암을 갖는 이름이지만, 그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살필 것을 깨우치게 한다.
애도는 우리가 이만큼 살아내고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인사가 되기도 한다. 매년 오세인과 현석, 키디다, 크리스와 은용, 모모와 변희수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너를 기억하는 이들이 이렇게 너를 부르고 기억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너의 스킨십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아직도 네 체온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영훈과 희영을 보면서 그 ‘토굴’같던 술집이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판데믹의 시기에도 '우리'를 지키며 치정과 외로움을,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되뇌이며 술잔을 기울인다. 나환과 도진, 찬혁을 생각하면서 가깝고 먼 거리에서 언제라도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나눴던 이런저런 아무런 기획들을 새삼 기억해낸다. (어떤 지면에서건 이들의 이름을 한번 쯤은 불러보고 싶었다.)
떠난 동료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저 세상을 떠난 당신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 속에 지금은 행성인에서 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또한 떠올리게 한다.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들의 얼굴까지 생각할 때, 분명하게 떠오르는 감정은 그리움이다. 이 날은 노쇼 신청자들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언제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단해지다가 말랑하게 이상한 만남들을 열 수 있는 토끼굴들을 만드는게 활동은 아닐까도 생각한다. 서로 정신없이 굴을 파나가다 가끔 바깥에 나와 숨통을 틔우며 한번씩 지친 얼굴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다면 좋겠다.
'행성인 활동 > 활동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성인 5월 정기회원모임 후기 (0) | 2022.05.29 |
|---|---|
| 제 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마지막 세션 후기: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 <우리가 보내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0) | 2022.05.26 |
| 애도의 기억, 무지개 봄꽃들의 시간- #2 다시 만난 무지개 봄꽃 (0) | 2022.04.29 |
| 차별금지법 4월 쟁취 평등텐트촌 24시 행동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길' 스케치 (0) | 2022.04.28 |
| 임원교육후기 - 갈등을 줄이는 의사결정 (0) | 2022.03.28 |